■ 해담의 서화만평 海潭의 書畵漫評(51)
- 서예 작품을 액자에 넣지 말자
☛ 작품을 남기고자 하거나 남에게 기증할 때 액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안 하는 것이 좋을까? 기증 작품일 경우 액자나 표구하지 않으면 실례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옳은 말이다. 완제품을 줘야지 반제품을 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실례일 수 있을 것이나, 좀 달리 생각해 보자. 물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작품을 표구하거나 액자에 넣지 말아야 한다.‘라 말하고 싶다. 낙관까지 마친 작품을 그냥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서예의 최대 특징은 ’서여기인‘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전통서예의 정수라 하겠다. 서예는 시간성 미술이다. 흐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 서예도 한 번 쓰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은 획에 덧칠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부터 한번 쓴 획에 ’가필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가필은 본래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면 안 한 것만 못하게 되기에 ’하지 말라‘ 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획에 가필이 있으면 흐름의 맥락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작품에서 서여기인의 효과, 기운, 생동감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느낌은 서예 이외의 다른 미술 장르에서는 느끼기 힘든 서예만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최대한 살릴 방법은 없을까? 있다고 본다. 낙관까지 마친 작품을 액자에 넣지 않는 것, ’표상을 표상‘하지 않는 것이다. 뭔 말일까?
예를 들어보자. 퇴계 선생이 애인같이 사랑하는 매화가 창밖에 있고, 그 매화를 날마다 즐긴다고 하자. 어느 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자 그 매화를 그렸다 하자. 같은 매화이지만 그림 속의 매화는 창 밖 매화와 너무 다른 느낌의 매화일 수밖에 없다. 그림의 매화는 매화를 표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밖의 매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고, 그림의 매화는 대상의 표상일 뿐이다. 퇴계는 대상인 매화에 물도 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림으로 표상된 매화는 실존 매화를 상징적으로 표상한 것이기에 아무리 매화를 사랑하는 퇴계라 하더라도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액자 속에 넣어 벽에 걸어둔다면 어떻게 될까? 퇴계와 매화 사이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액자 속의 매화는 다른 세계의 매화같이 느껴질 것이다. 액자에 넣지 않았을 때보다 생동감이 떨어짐은 당연하다. 동물원의 우리, 방, 경계에서 느끼듯 액자는 이 세상과의 단절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표상한 대상을 다시 한번 틀에 넣는 것을 심리학에서 ’표상의 표상‘이라 한다.
☛ 위의 예와 같이 대상은 표상할수록 원본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서에 작품으로 생각해 보면 더욱 실감이 간다. 낙관을 마친 자신의 작품은 대상이며 바로 나를 대변하는 느낌이 난다. 이것을 액자에 넣고나면 시집보낸 딸 같은 느낌이라 할까 나의 범위를 벗어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것을 도록을 통해 보게되면 더욱 멀어져 별 감흥이 없게 된다. 도록의 작품은 표상의 표상을 또 표상하는 것이니 원본과 더욱 멀어진다. 그래서 나는 가끔 농담으로 ’도록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서예 작품일 경우 감상자는 가능하면 원본으로 감상해야 하고, 도록은 어디까지나 증명이며 참고자료라 생각해도 될 것이다. 특히 서예작품은 도록에서 심하게 축소된다. 이로인해 묵색, 번짐, 비백 등 작품의 기운을 좌우하는 미세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원본의 기운을 느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시장에 온 손님은 원작을 보게 되니 도록의 작품을 이해할 것이나, 도록만 본 감상자는 원본의 아우라를 느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도록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고, 만들드라도 전시장 방문객에게만 주는 것이 좋다 하겠는데 어디까지나 불편한 진실일 뿐 현실은 이러하지 못하다.
서예작품은, 기증 작품도 그렇지만 후손을 생각하여 보관하고 싶다면 낙관처리 후 표구하지 말고 원작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젠가 후대가 이 작품을 꺼내 봤을 때의 느낌, 작가의 정감이 생동하는 그 느낌은 문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아마도 〈세한도〉를 손에 넣었던 후지쓰카나, 결국 후지쓰까로부터 〈세한도〉를 얻은 손재형이 느꼈던 그 어떤 느낌과도 같을 것이다(본 연재 183호 ”〈세한도〉의 흐름과 손재형“ 참조). 그리고 당(唐)의 태종도 왕희지의 〈난정서〉를 액자에 넣었다면 무덤까지는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서예는 표상을 하면할수록 원본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 이상으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액자와 서예의 감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서에 작품을 액자에 넣지 말자‘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액자는 필요하나 부작용도 동반한다. 서예 감상은 간찰(簡札)에서와 같은 필흔(筆痕)이나 ’서여기인‘적 느낌이 중요하고, 이러한 면에서 액자를 하더라도 유리창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구는 그래도 좀 덜하다. 액자는 초월의 느낌, 남의 세상이라는 느낌이 든다. ’작품을 액자에 넣지 말자‘는 것은 느낌상 ’표상의 표상‘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액자에 넣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액자가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가끔 반닫이에 보관한 작품을 펼쳐볼 때의 설렘은 차라리 경외라 해도 될 것이다.
해담 오후규 (서화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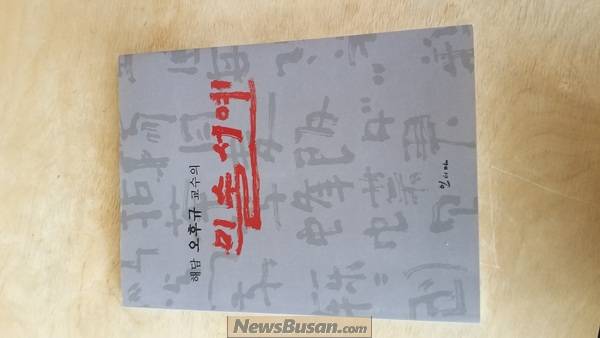 ▲ 해담 오후규, 미술서예.
▲ 해담 오후규, 미술서예. ‘정상빈-홍윤상 선발’ 올림픽대표팀, 일본전 선발명단 발표
뉴스부산=일본과의 파리올림픽 지역예선 세 번째 경기에 나서는 올림픽대표팀의 선발 명단이 발표됐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일본, UAE, 중국과 함께 B조에 속해 있다.앞서 한국...
‘정상빈-홍윤상 선발’ 올림픽대표팀, 일본전 선발명단 발표
뉴스부산=일본과의 파리올림픽 지역예선 세 번째 경기에 나서는 올림픽대표팀의 선발 명단이 발표됐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일본, UAE, 중국과 함께 B조에 속해 있다.앞서 한국...
 부산시 소통캠페인 홍보대사에 '미스트롯3' 가수 정서주 씨 위촉
뉴스부산=부산시는 시 소통캠페인 홍보대사로 가수 정서주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열렸으며,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정서주 씨는 부산 수영구 출신으로 2008년생이다. 인기 트로트 경연 티브이(TV) 프로그램인 '미스트롯3'에서 1위를...
부산시 소통캠페인 홍보대사에 '미스트롯3' 가수 정서주 씨 위촉
뉴스부산=부산시는 시 소통캠페인 홍보대사로 가수 정서주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열렸으며,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정서주 씨는 부산 수영구 출신으로 2008년생이다. 인기 트로트 경연 티브이(TV) 프로그램인 '미스트롯3'에서 1위를...
 김민우 결승골 한국, 일본에 1-0 승... 26일 인도네시아와 8강
뉴스부산=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2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B조 3차전에서 김민우의 결승골로 일본에 1-0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일본(2승 1패, 승점 6점)을 제치고 B조 1위를 차지한 한국(3승, 승점 9점)은 8강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
김민우 결승골 한국, 일본에 1-0 승... 26일 인도네시아와 8강
뉴스부산=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2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B조 3차전에서 김민우의 결승골로 일본에 1-0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일본(2승 1패, 승점 6점)을 제치고 B조 1위를 차지한 한국(3승, 승점 9점)은 8강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
 경찰청, 국민에게 감동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뉴스부산=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 모범 경찰관 8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고 이날 밝혔다.행사에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들을 돌봐온 것으로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성우 경감이 참석했다. 근무가 없는 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
경찰청, 국민에게 감동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뉴스부산=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 모범 경찰관 8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고 이날 밝혔다.행사에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들을 돌봐온 것으로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성우 경감이 참석했다. 근무가 없는 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
 인사혁신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 제출"
뉴스부산=올해부터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23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
인사혁신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 제출"
뉴스부산=올해부터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23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대한민국의 국보 제310호
☞국보 제310호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백자 달항아리(白磁 壺)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백자이다. '백자대호(白磁大壺)'라는 명칭으로 지난 2004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보물 제1424호에 지정됐으나, 2007년 12월 17일 국보 제310호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이날자로 보물에서 지정해제됐다. 백자대호 명칭은 2011...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 대한민국의 국보 제310호
☞국보 제310호 백자 달항아리 (白磁 壺)백자 달항아리(白磁 壺)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백자이다. '백자대호(白磁大壺)'라는 명칭으로 지난 2004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보물 제1424호에 지정됐으나, 2007년 12월 17일 국보 제310호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이날자로 보물에서 지정해제됐다. 백자대호 명칭은 2011...
 이태석 3경기 연속 도움 ... 한국선수 올림픽 예선 최초
뉴스부산=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지난 22일 김민우(뒤셀도르프)의 헤더 결승골로 ‘숙적’ 일본을 물리치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3전승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UAE(1-0 승), 중국(2-0 승)에 이어 일본을 상대로 모두 무실점 승리하며 조 1위로 8강에 오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은 조별리그 3...
이태석 3경기 연속 도움 ... 한국선수 올림픽 예선 최초
뉴스부산=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지난 22일 김민우(뒤셀도르프)의 헤더 결승골로 ‘숙적’ 일본을 물리치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3전승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UAE(1-0 승), 중국(2-0 승)에 이어 일본을 상대로 모두 무실점 승리하며 조 1위로 8강에 오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은 조별리그 3...
 인니에 충격패 황선홍호,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좌절
뉴스부산=황선홍호가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 8강전 충격패를 당하며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온 본선 연속 진출 기록을 9회로 마감했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한국 축구 대표팀은 26일(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전·..
인니에 충격패 황선홍호,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좌절
뉴스부산=황선홍호가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 8강전 충격패를 당하며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온 본선 연속 진출 기록을 9회로 마감했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한국 축구 대표팀은 26일(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전·..